쓰웅씬(釋用信, 50)은 유명한 싸우린쓰(小林寺)의 방장, 중국불교협회부회장 및 9~12대 전인대 대표(우리의 4선 국회의원에 해당)이다. 그의 성추문 때문에 중국 불교계가 들끓고 있다. 독일 언론은 그와 관계한 베이징대 예술학과 여학생이 사생아를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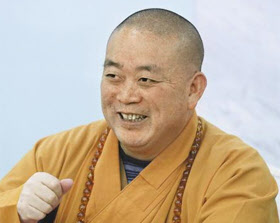
- 스융신 방장/조선일보DB
조선시대의 패설문학에 스님의 정사(情事)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때는 유교를 숭상하였으므로 일부러 불교의 이미지를 더럽혔기 때문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년 전 필자는 중국 산시(山西) 타이웬(太原) 부근의 우타이산(五臺山)을 관광한 적이 있다. 중국에는 사찰이 수없이 많지만 대부분 빈집뿐이고 스님이 없다. 그런데 우타이산에는 스님이 5000명이나 있으니 정말 장관이었다.
현지 20대 여성 가이드에게 “이곳 스님들 연애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가이드는 정색하며 “스님이 어떻게 연애하는가? 당신은 학자라며 이런 상식도 모르는가?”라고 힐난했다. 필자는 이내 “농담이다, 농담”이라고 얼버무렸다.

- 우타이산의 전경. 탑원사의 백탑이 눈에 띈다. /위키피디아
스님도 인(人)이지 신(神)이 아니다. 인간의 칠정육욕(七情六欲)이 스님에게도 있기 마련이다. 인간에게는 ‘본연의 얼굴’, ‘자제된 얼굴’, ‘승화된 얼굴’이 있다. 수요에 따라 때로는 자제된 얼굴, 때로는 승화된 얼굴을 나타내지만 본연의 얼굴은 크게 다를 바 없다. 프로이드의 책 <정신분석법>에 이렇게 씌어 있다.
무칙천 황제가 한번은 고승 다섯을 불러 “당신들은 색욕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신수(新秀), 현약(玄約), 노안(老安), 현색(玄賾) 네 고승은 없다고 잡아뗐다. 유독 선선(詵禪)만이 “색욕이 있다. 살아 있는 한 있고 죽어야 없다”라고 답하였다. 남조 송의 제종(濟宗) 스님은 심지어 “술, 고기, 도둑질, 오입질은 불교를 터득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사찰은 남자스님의 묘(廟)와 비구니의 암(庵)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 암은 묘에서 반경 1㎞ 안에 있다. 편리한 연애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고 보면 스님의 금욕은 체면·자제·승화된 얼굴에 불과하고 사실은 세속사람과 비슷한 생활을 한 스님도 적지 않았겠다.
문헌 중 가장 이른 스님의 정사에 관한 기록은 남조 양원제(梁元帝·552~555재위)의 비녀 서소패(徐昭佩)가 요광사(瑤光寺)의 스님 지원도인(智遠道人)과 사통한 것이다. 중국역사상 스님과 궁궐 안 요인과 사통한 예는 너무나 많다. 무칙천(武則天) 여황제가 대표적 인물이다.
무칙천이 처음 사통한 남자는 스님이었다. 당태종이 사망한 후 비녀 무칙천은 감업사(感業寺)의 비구니가 되어 지척 백마사(白馬寺)의 스님 풍소보(馮小寶)와 사통하였다. 황제가 된 후에 풍소보는 백마사 주지로 됐고 후궁에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설회의(薛懷義)라는 성명도 하사받았다. 당태종의 고양(高陽)공주와 무칙천의 태평(太平)공주는 다 스님과 사통하였다.
이욱(李煜)은 남조 후당(後唐) 망국의 황제이다. 한번은 그가 변복 차림으로 기생집에 가서 장석(張席)이란 스님과 부딪쳤다. 장석이 먼저 왔으므로 존중하여 자기가 정사를 나누려던 기생을 장석에게 양보하고 살며시 떠나버렸다. 뿐만 아니라 ‘원양사의 스님은 풍류의 불법을 수련하네’라는 시를 써놓았다. 스님·황제·기생 간의 로맨틱한 정사의 일화이다.
여인들은 왜 스님과 사통하기를 좋아하는가? <수호전>의 두령 양웅(楊雄)의 처 반교운(潘巧雲)은 스님 배여해(裵如海)와 사통하다가 발각되어 능지처참을 당하였다. 죽기 직전 반교운은 양웅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배 스님과의 하룻밤이 당신과 10년 밤보다 더 재미있었다.”
스님에게 정말 이렇듯 큰 매력이 있을까? 이는 ‘인자견인(仁者見仁), 지자견지(知者見智)’(동일한 객체라도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에 불과하며 누구도 정답을 줄 수 없는 주제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