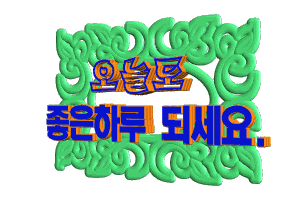|
|





창덕궁(昌德宮) 후원(後苑)
창덕궁은 궁궐로서보다는
‘비원’(秘苑)으로 익숙한 곳이다.
비원(秘苑)이란 창덕궁과 창경궁에 딸린
북쪽의 정원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용어는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을 주로
후원(後苑)이라 불렀고,
때로는 내원(內苑), 상림원(上林苑),
금원(禁苑)으로 불렀다.
비원(秘苑)이란 말은 1908년부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유포돼
해방 뒤에도 별 반성 없이
최근까지 통용되고 있는 용어일 뿐이다.






자연의 구릉과 계곡,
폭포와 숲에 최소한의 인공을 가해
가다듬고 여기에 어울리게 연못, 화계,
취병(翠屛, 꽃나무의 가지를 틀어서 문이나 병풍처럼 만든 것)을
가꾸어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창덕궁 후원(後苑)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우리 전통 정원을 대표하는 명소이다.
후원(後苑)은 왕과 왕실 사람들의
휴식처였을 뿐 아니라
국왕과 왕자들이 글을 읽고
학문을 연마하거나 과거시험을
치르기도 했던 곳이다.
또 임금이 논밭을 갈고
왕비가 누에를 치는 일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며,
『궁궐지』에는 역대 임금이 여기에 있는
누각과 정자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읊은 시와 글, 상량문과
기문들이 수도 없이 나오니,
이곳은 궁중문학의 산실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곳은 정조왕의 꿈이 서린 곳이었다.
그는 후원(後苑)에 규장각을 세우고
여러 서고(書庫)를 지어 왕실도서관을 마련하고
규장각 각신들을 길러내어
새로운 정치와 문화를 펼치려고 하였다.

부용정(芙蓉亭)
- 위 치:~
-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昌德宮) 후원(後苑:금원)에 있는 정자.
정면 5칸, 측면 4칸, 배면 3칸으로 되어 있다.
평면의 기본형은 정면만을
다각(多角)으로 접어 5칸이 되게 한
十자형의 특수평면인데,
배면 한 칸은 연못에 높은 석주(石柱)를 세우고
수중누각(水中樓閣)이 되게 하였다.
연못에 떠 있는 누간(樓間)을
지상건물보다 약간 높여
수상건물과 지상건물과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평면의 생긴 모양대로
쪽마루를 꺾어 내부에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브라우저에서는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E9이상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레이어 닫기

부용지(芙蓉池) 남쪽에서 북향하고 있는
작은 정자는 부용정(芙蓉亭)으로,
숙종왕이 세운 택수재를
정조왕이 고쳐 지은 것이다.
당시 정조왕은
상량문을 직접 쓰기도 했으며
정자가 완공된 뒤에는
여러 차례 이곳에 올라
신하들과 더불어 시를 읊고
글을 짓기도 했으며,
상화조어
(賞花釣魚: 꽃을 감상하고 고기를 낚는 일)를
하기도 했다.

영화당(暎花堂)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선조왕 재위 5년(1572)에 춘당대(春塘臺)에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일 때
여기에 임어했으며
광해군도 이곳에서 꽃구경을 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임진왜란 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건물은
숙종왕 18년(1692)에 개건한 것이다.
그후 이용이 활발했던 듯
숙종왕은 왕자와 왕손을 모아
꽃구경을 하고 시(詩)를 쓰기도 했으며,
영조왕은 공신들을 접견하고
시(詩)를 하사하기도 했고,
순조왕 때에는 문무신하들이 이곳에 모여
시예(試藝)를 겨루기도 했다.
영화당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춘당지(春堂池)와 춘당대이다.
춘당지는 후원의
북쪽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부용지에서 동으로 흘러드는 물이
모여드는 연못으로
창경궁의 춘당지가 바로 그것이며,
춘당지에서부터 영화당에 이르는
평평하고 높직한 마당을 춘당대라 한다.
지금은 창경궁과 나뉘는
담장에 가로막혀 일부밖에 볼 수 없는
이 춘당대는 조선시대 선비라면
누구라도 한번쯤 서보기를 소원했던 곳이다.
몇 단계로 되어 있는 과거 절차 가운데
국왕이 친림(親臨)하는 최종시험인
전시(殿試)가 이곳에서 열렸던 것이다.
「춘향전」에서 이 도령이
장원급제할 때의 과거시험 문제[科題]였던
‘춘당춘색고금동’(春塘春色古今同)에
나오는 ‘춘당’도 바로 이곳의
춘당지와 춘당대를 가리키는 것이니,
춘당대의 유명세를 짐작할 만하다 하겠다.
아무튼 이렇게 전시가 열리면
임금은 영화당에 거둥하여 시험을 참관했다.
그러니까 영화당은 고사 본부였던 셈이다.




불로문(不老門)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세워진 문으로 창덕궁 연경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세워진 돌문이다.
세로판석에 돌쩌귀 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나무문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 문을 지나가는 사람은
무병장수한다고 전해진다.
‘궁궐지’에 의하면,
불로문(不老門) 앞에는
불로지(不老池)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앞에 불로문이 있어
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문은 하나의 판석을
ㄷ자 모양으로 깎은 뒤 다듬은 것이다.

문(門)의 윗부분에
전서체로 불로문(不老門)이라 새겨져 있다.
지금의 불로문(不老門)은
창덕궁 궁궐 배치도인
‘동궐도(東闕圖)’에 나와 있는
모습과 일치하지만 주변 풍경은
그림과 많이 다르다.
마치 종이로 오려낸 듯한
단순한 형태이지만 두께가 일정하게
돌을 다듬은 기술이 세밀하다.
불로문(不老門)과 잇달려 있는 담장과의
조화로움에서도 전통 조형물의
우수함을 엿볼 수 있다.

애련지(愛蓮池)와 애련정(愛蓮亭)
조선시대 숙종왕 18년에 세워진
창덕궁 후원의 연못과 정자각으로,
'애련(愛蓮)'이란 명칭은
송나라 유학자 주돈이의
시(詩) '애련설(愛蓮說)'에서 유래하였다.
숙종왕이 지은
‘애련정기(愛蓮亭記)’가
‘궁궐지(宮闕志)’에 전한다.

'연꽃이 피는 연못’이라는 뜻인
애련지(愛蓮池)는 창덕궁 불로문(不老門)을
지나 왼쪽에 자리하고 있고,
애련지 북쪽에 서 있는
간결한 정자가 애련정(愛蓮亭)이다.
애련지는 부용지와 달리
가운데 섬이 없는 방지(方池)로,
사방을 장대석으로 쌓아올렸다.
입수구가 독특한데,
흘러내리는 도랑물을 물길을 따라
폭포수처럼 떨어지게 만들었다.
원래는 연못 옆에
어수당(魚水堂)이라는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애련정은 숙종 18년(1692)에
애련지의 물가에 지은 것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의 이익공의
사모지붕 양식을 띠고 있다.
일반 건물에 비해 추녀가 길며
추녀 끝에는 잉어 모양의 토수가 있다.
물 기운으로 불 기운을 막는다는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것이다,
건물을 받치는 네 기둥 가운데
두 기둥은 연못 속에 잠겨 있는
초석 위에 세워져 있다.
정자 사방으로 평난간을 둘렀는데,
낙양창 사이로 사계절이 변하는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창덕궁 후원(後苑)은
북한산과 응봉에서 뻗어내려
수림(樹林)이 울창한 자연스런 구릉지대에
점점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만든
정원으로 넓이는 약 9만여 평에 이른다.
원래는 창경궁의 후원(後苑)과
서로 연결되어 구분이 없었으나
일제가 조선 말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개조하면서
두 궁궐의 후원(後苑)에 담장을 쌓아
지금처럼 분리되었다.
이곳은 조선시대 궁궐의
후원(後苑) 가운데 가장 넓고 경치가 아름다워
일찍부터 왕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 때문에 여러 왕에 의해
많은 누정이 지어져서
한때 100여 개 이상의 누각과
정자가 들어서기도 했으나
지금은 누각 18채와
정자 22채만 남아 있을 뿐이다.
창덕궁 후원(後苑)은
북한산과 응봉에서 뻗어내려
수림(樹林)이 울창한 자연스런 구릉지대에
점점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만든
정원으로 넓이는 약 9만여 평에 이른다.
원래는 창경궁의 후원(後苑)과
서로 연결되어 구분이 없었으나
일제가 조선 말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개조하면서
두 궁궐의 후원(後苑)에 담장을 쌓아
지금처럼 분리되었다.
이곳은 조선시대 궁궐의
후원(後苑) 가운데 가장 넓고 경치가 아름다워
일찍부터 왕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 때문에 여러 왕에 의해
많은 누정이 지어져서
한때 100여 개 이상의 누각과
정자가 들어서기도 했으나
지금은 누각 18채와
정자 22채만 남아 있을 뿐이다.


 존덕정(尊德亭)
창덕궁의 후원에 있는 연못인
존덕지(尊德池)에 만들어진 정자이며
이중지붕 구조의 육각지붕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구조이다.
조선시대 인조(仁祖)왕 재위 22년인
서기1644년에 만들어졌으며
당시에는 육모정이라고 불렀다.
정자의 마루도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되어 2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다.
천정은 우물정자로 구성되고
보개 천정과 같이
화려한 장식으로 구성되고
가운데 황룡과 청룡이 장식되어 있다.
또한 정조(正祖)왕이 지은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
현판이 걸려있다.
존덕정(尊德亭)
창덕궁의 후원에 있는 연못인
존덕지(尊德池)에 만들어진 정자이며
이중지붕 구조의 육각지붕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구조이다.
조선시대 인조(仁祖)왕 재위 22년인
서기1644년에 만들어졌으며
당시에는 육모정이라고 불렀다.
정자의 마루도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되어 2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다.
천정은 우물정자로 구성되고
보개 천정과 같이
화려한 장식으로 구성되고
가운데 황룡과 청룡이 장식되어 있다.
또한 정조(正祖)왕이 지은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
현판이 걸려있다.

 존덕정(尊德亭) 앞 석교(石橋)
석교(石橋) 다리의 설치자는 미상이지만
필자인 저에게는 예사롭지가 않아서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다리아래로 배수로가 있는데
존덕정(尊德亭)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배수구가 있는것로 봐서
아마도 존덕정(尊德亭)을 지을때
같은 시기에만들어진것이 아니였나 싶네요.
존덕정(尊德亭) 앞 석교(石橋)
석교(石橋) 다리의 설치자는 미상이지만
필자인 저에게는 예사롭지가 않아서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다리아래로 배수로가 있는데
존덕정(尊德亭)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배수구가 있는것로 봐서
아마도 존덕정(尊德亭)을 지을때
같은 시기에만들어진것이 아니였나 싶네요.






 소요정(逍遙亭)
인조왕 14년(1636)에 세웠으며
탄서정(歎逝亭)이라 부르다가
후에 소요정(逍遙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창덕궁 후원의 취한정 위쪽,
옥류천 바로 옆에 있다.
정자에 앉으면 옥류천과
소요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정면 1칸·측면 1칸의
익공계 사모지붕 형식 정자이며,
계자난간을 둘렀다.
숙종왕, 정조왕, 순조왕 등이
이곳의 경치를 묘사한 시(詩)를 남겼다.
옥류천변의 소요정·청의정·태극정은
상림삼정(上林三亭)이라 칭해졌다.
소요정(逍遙亭)
인조왕 14년(1636)에 세웠으며
탄서정(歎逝亭)이라 부르다가
후에 소요정(逍遙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창덕궁 후원의 취한정 위쪽,
옥류천 바로 옆에 있다.
정자에 앉으면 옥류천과
소요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정면 1칸·측면 1칸의
익공계 사모지붕 형식 정자이며,
계자난간을 둘렀다.
숙종왕, 정조왕, 순조왕 등이
이곳의 경치를 묘사한 시(詩)를 남겼다.
옥류천변의 소요정·청의정·태극정은
상림삼정(上林三亭)이라 칭해졌다.

 옥류천(玉流川)
창덕궁 후원 북쪽의 깊은 골짜기에 있으며
인조왕 14년(1636)에 조성하였다.
북악산 동쪽 줄기에서 흐르는 물과
인조왕이 팠다고 알려진
어정(御井)으로부터 계류가 흐른다.
소요암이라는 널찍한 바위에
U자형 홈을 파고,
샘물을 끌어 올린 다음
작은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임금은 이곳에서 신하들과 더불어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었다고 한다.
청의정·소요정·태극정·농산정·취한정 등의
정자가 옥류천 옆에 있다.
옥류천(玉流川)
창덕궁 후원 북쪽의 깊은 골짜기에 있으며
인조왕 14년(1636)에 조성하였다.
북악산 동쪽 줄기에서 흐르는 물과
인조왕이 팠다고 알려진
어정(御井)으로부터 계류가 흐른다.
소요암이라는 널찍한 바위에
U자형 홈을 파고,
샘물을 끌어 올린 다음
작은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임금은 이곳에서 신하들과 더불어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었다고 한다.
청의정·소요정·태극정·농산정·취한정 등의
정자가 옥류천 옆에 있다.



 소요암(逍遙巖)
소요암(逍遙巖)

 소요암(逍遙巖)에는 인조왕이 쓴
옥류천(玉流川)이라는 글씨를 비롯하여
숙종왕이 지은 시(詩)가 새겨져 있다.
소요암(逍遙巖)에는 인조왕이 쓴
옥류천(玉流川)이라는 글씨를 비롯하여
숙종왕이 지은 시(詩)가 새겨져 있다.

 청의정(淸漪亭)
창덕궁의 후원 옥류천 일원의
북쪽에 자리하고있는
궁궐안의 유일한 초가정자이다.
서기 1920년대에 제작한 "동궝도"에는
열여섯채의 초가가 보이지만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청의정만 볏짚으로 덮혀있다.
하지만 지붕아래로는
단청을하여 궁궐건물로 격식을 차렸다.
청의정(淸漪亭) 앞에는
작은 논을 마련하여 왕이
직접 모를 내고 벼를 베는
친경(親耕)을 하였다.
청의정(淸漪亭)
창덕궁의 후원 옥류천 일원의
북쪽에 자리하고있는
궁궐안의 유일한 초가정자이다.
서기 1920년대에 제작한 "동궝도"에는
열여섯채의 초가가 보이지만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청의정만 볏짚으로 덮혀있다.
하지만 지붕아래로는
단청을하여 궁궐건물로 격식을 차렸다.
청의정(淸漪亭) 앞에는
작은 논을 마련하여 왕이
직접 모를 내고 벼를 베는
친경(親耕)을 하였다.

 태극정(太極亭)
창덕궁 후원 옥류천 주변에 있는 정자이다.
인조 14년(1636)에 세웠으며,
원래 운영정(雲影亭)이라 불렀다가
태극정(太極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굴도리를 엮은
정면 1칸·측면 1칸 크기의
겹처마 사각정자이다.
내부에 마루를 깔고
퇴를 달아 평난간을 둘렀다.
천정은 우물천정이고,
지붕 꼭대기는
절병통을 얹어 마무리하였다.
정조왕의 ‘태극정시(太極亭詩)’,
숙종왕의 ‘상림삼정기(上林三亭記)’ 등
태극정(太極亭)을 노래한
어제(御製)가 전해진다.
상림삼정(上林三亭)이란 옥류천변의
소요정·청의정·태극정을 일컫는 말이다.
태극정(太極亭)은 다른 정자들과 달리
높은 장대석 기단 위에 지어졌다.
천장이 우물 천장의 형식이고
기둥의 문설주로 보아
비(雨)나 추위를 피하도록 고안된 정자이다.
태극정(太極亭)
창덕궁 후원 옥류천 주변에 있는 정자이다.
인조 14년(1636)에 세웠으며,
원래 운영정(雲影亭)이라 불렀다가
태극정(太極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굴도리를 엮은
정면 1칸·측면 1칸 크기의
겹처마 사각정자이다.
내부에 마루를 깔고
퇴를 달아 평난간을 둘렀다.
천정은 우물천정이고,
지붕 꼭대기는
절병통을 얹어 마무리하였다.
정조왕의 ‘태극정시(太極亭詩)’,
숙종왕의 ‘상림삼정기(上林三亭記)’ 등
태극정(太極亭)을 노래한
어제(御製)가 전해진다.
상림삼정(上林三亭)이란 옥류천변의
소요정·청의정·태극정을 일컫는 말이다.
태극정(太極亭)은 다른 정자들과 달리
높은 장대석 기단 위에 지어졌다.
천장이 우물 천장의 형식이고
기둥의 문설주로 보아
비(雨)나 추위를 피하도록 고안된 정자이다.


 연경당(演慶堂)
연경당은 후원의 첫째구역인
주합루(宙合樓)·영화당(暎花堂) 일곽을 지나
애련정(愛蓮亭)과 애련지(愛蓮池) 및
의두합(倚斗閤 : 같은 건물의 동쪽 누는 영춘루, 남쪽 마루는 기오헌이다)·
운경거(韻磬居) 등이 조성되어 있는 곳
안쪽 아늑한 골짜기에 있다.
삼면이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만이 트여 있는데
이곳에 애련정과 애련지가 배치되어 있다.
건축의 향은 정남향으로 하고,
북·동·서 삼면이 산으로 둘러막힌 곳에
북서쪽에서 흘러나온 물이 남쪽,
즉 집앞을 거쳐 동쪽으로 빠져나가도록
물길을 내어 풍수적으로 명당을 형성한 다음,
방위에 맞추어 직각으로 건물군을 배치하였다.
배치형식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예에 따라
맨 앞쪽에 행랑채를 두 겹으로 두르고,
중문(中門)이 있는 행랑채에
각각 사랑채와 안채로 통하는
출입문을 좌우로 벌려 냈다.
연경당(演慶堂)
연경당은 후원의 첫째구역인
주합루(宙合樓)·영화당(暎花堂) 일곽을 지나
애련정(愛蓮亭)과 애련지(愛蓮池) 및
의두합(倚斗閤 : 같은 건물의 동쪽 누는 영춘루, 남쪽 마루는 기오헌이다)·
운경거(韻磬居) 등이 조성되어 있는 곳
안쪽 아늑한 골짜기에 있다.
삼면이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만이 트여 있는데
이곳에 애련정과 애련지가 배치되어 있다.
건축의 향은 정남향으로 하고,
북·동·서 삼면이 산으로 둘러막힌 곳에
북서쪽에서 흘러나온 물이 남쪽,
즉 집앞을 거쳐 동쪽으로 빠져나가도록
물길을 내어 풍수적으로 명당을 형성한 다음,
방위에 맞추어 직각으로 건물군을 배치하였다.
배치형식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예에 따라
맨 앞쪽에 행랑채를 두 겹으로 두르고,
중문(中門)이 있는 행랑채에
각각 사랑채와 안채로 통하는
출입문을 좌우로 벌려 냈다.






 궁궐의 후원(後苑) 안에 지어졌으면서도
사랑채·안채·안행랑채·바깥행랑채·
반빗간·서재·후원·정자 및 연못을
완벽하게 갖춘 주택건축이다.
이른바 99칸집이라 불리고 있으나
현재 건물의 실제규모는 109칸 반이다.
연경당은 사랑채의 당호(堂號)이자
집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동궐도(東闕圖)」에는
반빗간(반찬을 만드는 곳. 일명 찬간) 구역에
5칸 규모의 창고와 5칸 규모의 행각(行閣)이 있고,
측간 1칸, 헛간 3칸이 그려져 있어서
원래의 총 규모는 123칸 반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궁궐지(宮闕誌)』에는
120칸으로 적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궁궐의 후원(後苑) 안에 지어졌으면서도
사랑채·안채·안행랑채·바깥행랑채·
반빗간·서재·후원·정자 및 연못을
완벽하게 갖춘 주택건축이다.
이른바 99칸집이라 불리고 있으나
현재 건물의 실제규모는 109칸 반이다.
연경당은 사랑채의 당호(堂號)이자
집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동궐도(東闕圖)」에는
반빗간(반찬을 만드는 곳. 일명 찬간) 구역에
5칸 규모의 창고와 5칸 규모의 행각(行閣)이 있고,
측간 1칸, 헛간 3칸이 그려져 있어서
원래의 총 규모는 123칸 반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궁궐지(宮闕誌)』에는
120칸으로 적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창덕궁 연경당은
1828년(순조왕 28년)에 창건되었으며,
사대부의 생활을 알기 위하여
세자(1830년에 죽은 뒤 익종으로 높임)가
왕께 요청한 것이 건립동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국여지비고』·『궁궐지』·
『순조무자진작의궤부편(純祖戊子進爵儀軌附編)』·
『순조실록』·「동궐도」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 보면,
연경당은 1827년에
진장각 옛터에 창건되었으며,
짓게 된 동기는 순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경축의식을 맞아서 이를 거행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연경(演慶)’이라는 이름도
경사스러운 행사를 연행(演行)한다는
의미에서 지은 것이다.
창덕궁 연경당은
1828년(순조왕 28년)에 창건되었으며,
사대부의 생활을 알기 위하여
세자(1830년에 죽은 뒤 익종으로 높임)가
왕께 요청한 것이 건립동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국여지비고』·『궁궐지』·
『순조무자진작의궤부편(純祖戊子進爵儀軌附編)』·
『순조실록』·「동궐도」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 보면,
연경당은 1827년에
진장각 옛터에 창건되었으며,
짓게 된 동기는 순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경축의식을 맞아서 이를 거행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연경(演慶)’이라는 이름도
경사스러운 행사를 연행(演行)한다는
의미에서 지은 것이다.




 이 집은 궁궐 내에 지어진
유일한 상류주택으로서 가치가 있다.
현재와 같은 주택으로 지어진
연대(年代)와 동기(動機) 등은 불분명하지만
조선후기 동안 이룩된 주택 및
궁궐건축의 의장(意匠)과 재료사용 및
공간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 집은 궁궐 내에 지어진
유일한 상류주택으로서 가치가 있다.
현재와 같은 주택으로 지어진
연대(年代)와 동기(動機) 등은 불분명하지만
조선후기 동안 이룩된 주택 및
궁궐건축의 의장(意匠)과 재료사용 및
공간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2 0 1 5. 6. 1 2. 시 곡(枾 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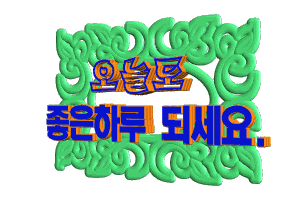
|
| |